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역설이 정점인 이 책은, 장편이라지만 얇은 소설책이라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책장을 넘기는 순간부터 그 역설을 마주하게 됩니다. 수백 권의 책들을 이 얇은 책 하나로 압축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의 무게감이 가득한 책. 그렇습니다. 저는 이 얇은 책을 다 읽는데 한 달이 꼬박 걸렸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웠고, 책장을 수십 번 다시 넘겼으며, 읽었던 것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 책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선, 현존하는 모든 지식과 철학, 역사, 신화, 종교 심지어 예술적 감각까지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 수많은 지식을 주인공 한탸의 폐지 압축기로 꾹꾹 눌러 담은 듯 한 이 책을, 사실 지금도 온전히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책이란 각자의 시선과 현재의 처지, 지식의 깊이 등에 따라 다르게 다가오는 것이기에 저는 이 책을 읽으며 제가 왜 그리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주절거려 볼까 합니다.
“삼십오 년째 나는 폐지를 압축하고 있다”
35년간 폐지를 압축해온 한탸는 더 이상 쓸모없어진 세상의 모든 지식을 폐기하여 압축합니다. 괴테, 니체, 칸트, 쇼펜하우어, 게르니카, 풀밭 위의 식사까지 모두 폐지로 압축됩니다. 종이, 활자, 정보, 기록, 사상, 지식, 가치, 예술, 문학 모든 것이 압축될 뿐입니다. 물리적으로 압축되어 폐기되어버리는 지식들, 더 이상 쓸모없는 가치들, 더 이상 쓸모없는 기억들, 더 이상 의미 없는 것들.
35년간 폐지를 압축해온 한탸는 지하실서 혼자 일합니다. 동료란 건 있을 수도 없고 그 누구도 그를 중요히 여기지 않지요. 아니 중요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것들을 폐기하고 압축하는 사람일 뿐이기 때문이죠. 아! 가끔은 찾습니다. 한탸가 술독에 빠지거나, 과거를 회상하느라 미처 압축하지 못한 폐지들이 쌓여있을 때? 라든가, 간혹 가다 지나간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이들이 찾아올 때? 라든가요.
이 책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선, 현존하는 모든 지식과 철학, 역사, 신화, 종교 심지어 예술적 감각까지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 수많은 지식을 주인공 한탸의 폐지 압축기로 꾹꾹 눌러 담은 듯 한 이 책을, 사실 지금도 온전히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책이란 각자의 시선과 현재의 처지, 지식의 깊이 등에 따라 다르게 다가오는 것이기에 저는 이 책을 읽으며 제가 왜 그리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주절거려 볼까 합니다.
“삼십오 년째 나는 폐지를 압축하고 있다”
35년간 폐지를 압축해온 한탸는 더 이상 쓸모없어진 세상의 모든 지식을 폐기하여 압축합니다. 괴테, 니체, 칸트, 쇼펜하우어, 게르니카, 풀밭 위의 식사까지 모두 폐지로 압축됩니다. 종이, 활자, 정보, 기록, 사상, 지식, 가치, 예술, 문학 모든 것이 압축될 뿐입니다. 물리적으로 압축되어 폐기되어버리는 지식들, 더 이상 쓸모없는 가치들, 더 이상 쓸모없는 기억들, 더 이상 의미 없는 것들.
35년간 폐지를 압축해온 한탸는 지하실서 혼자 일합니다. 동료란 건 있을 수도 없고 그 누구도 그를 중요히 여기지 않지요. 아니 중요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것들을 폐기하고 압축하는 사람일 뿐이기 때문이죠. 아! 가끔은 찾습니다. 한탸가 술독에 빠지거나, 과거를 회상하느라 미처 압축하지 못한 폐지들이 쌓여있을 때? 라든가, 간혹 가다 지나간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이들이 찾아올 때? 라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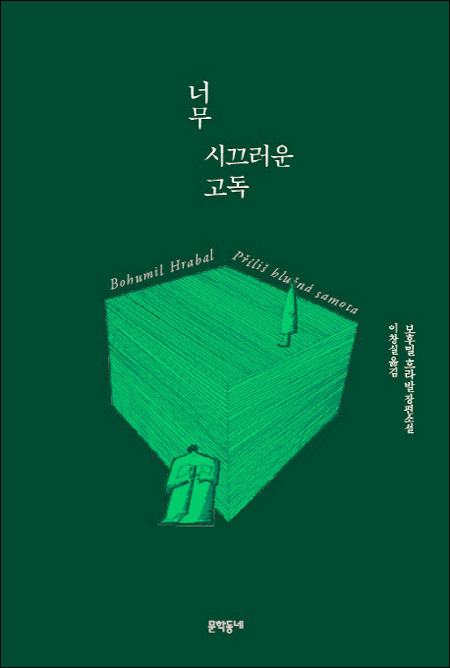
35년간 폐지를 압축해온 한탸는 컨테이너 벨트와 어마 무시한 크기의 전자동 압축시스템, 그리스로의 여행을 계획하는 자본주의 신세대들을 마주하곤 지나간 책들과 함께 스스로를 압축합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스스로를, 과거의 산물인 (그토록 사랑하는)폐지와 함께 압축하는 것이 한탸가 선택한 결말입니다.
“나는 4년째 어떤 한 기관의 문서를 폐기하고 있다.”
4년째 어떤 기관의 문서를 폐기하고 있는 저는 기록연구사입니다. 포대에 쌓인 폐기서류들, 빨리 폐기해 “주어야”하는 압박감. 폐기해주기 바라는 독촉 전화들. 엑셀 칸을 빽빽이 채운 폐기목록들. 톱니바퀴 속에 뭉텅이 채 들어가 갈아져 나오는 종이 파편들을 보면서 느끼는 희열감과 허탈함. 어두컴컴한 서고. 모빌랙 사이사이 바퀴벌레의 사체. 쾌쾌 묵어 먼지뿐인 (누군가에게는 필요할)기록을 정리하며 검게 그을린 손. 숨을 들이쉴 때마다 코 안을 간지럽히는 먼지들.
4년째 어떤 기관의 문서를 폐기하고 있는 저와 한탸는 슬프게도 무언가 비슷합니다. 조금 더 슬픈건 저는 한탸처럼 폐지 속 고전과 같은 보물들을 찾아내는 기쁨은 없다는 것이죠. 한탸가 느끼는 폐지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은 글쎄요? 가끔 정치면을 장식하는 기록물 관련 이슈들이 나올 때 설명가능한 정도의 자부심만 있을 뿐이죠. 사실 기록을 통해 과거를 이용하는 정치인들의 욕망은 수치스럽기까지 하고 그럴 “때”만 기록을 찾는 것 같아 아주 씁쓸하기도 합니다. 또 그러다가도 아니 차라리 이런 일이 아주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자조적인 푸념도 늘어놓습니다. 365일 선거철이어라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기록이, 기록물이, 어딘가에서 기록을 관리하는 이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되길, 잊혀지지 않길 바라면서 말이죠.
그렇다면 나의 결말은 어떨까요? 한탸의 선택처럼 기록의 무덤 속으로 들어가 조용한 연대를지키며 시대의 아우성을 속으로 삭혀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살아남아 잊혀져가는 것들을 지켜내야 할까요? 한탸는 지나간 것들의 표상인 자신이 더 이상 가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폐지와 하나가 되는 길을 선택한 것이겠지요. 하지만 여전히 종이, 활자, 기록, 책, 고전과 역사는 사라질 것만 같았던 미래 속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으니, 한탸의 선택이 조금 슬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희망을 가져봐도 될까요? 언젠가는 기록이, 잊혀져가는 것들이 가끔 나오는 정치 이슈가 아닌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소중한 가치를 발휘할 그날을 상상하면서요. 어떤 누군가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면서 삶이 정리된 일기장을 마주하며 웃음 짓거나, 치기어린 시절 삶의 기록을 발견해 얼굴이 붉어질 때처럼, 누구나 저마다의 기록을 만들고 소중히 여기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면 그 정도로도 만족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저의 결말은 너무나도 마주하기 힘들었던 한탸의 모습이 아니길 바래봅니다. 한탸는 잊혀졌지만, 기록과 가치는 여전히 남아, (계란처럼)살아서 죽은 바위를 뛰어넘을 수 있기를 말이지요.
4년째 어떤 기관의 문서를 폐기하고 있는 저는 기록연구사입니다. 포대에 쌓인 폐기서류들, 빨리 폐기해 “주어야”하는 압박감. 폐기해주기 바라는 독촉 전화들. 엑셀 칸을 빽빽이 채운 폐기목록들. 톱니바퀴 속에 뭉텅이 채 들어가 갈아져 나오는 종이 파편들을 보면서 느끼는 희열감과 허탈함. 어두컴컴한 서고. 모빌랙 사이사이 바퀴벌레의 사체. 쾌쾌 묵어 먼지뿐인 (누군가에게는 필요할)기록을 정리하며 검게 그을린 손. 숨을 들이쉴 때마다 코 안을 간지럽히는 먼지들.
4년째 어떤 기관의 문서를 폐기하고 있는 저와 한탸는 슬프게도 무언가 비슷합니다. 조금 더 슬픈건 저는 한탸처럼 폐지 속 고전과 같은 보물들을 찾아내는 기쁨은 없다는 것이죠. 한탸가 느끼는 폐지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은 글쎄요? 가끔 정치면을 장식하는 기록물 관련 이슈들이 나올 때 설명가능한 정도의 자부심만 있을 뿐이죠. 사실 기록을 통해 과거를 이용하는 정치인들의 욕망은 수치스럽기까지 하고 그럴 “때”만 기록을 찾는 것 같아 아주 씁쓸하기도 합니다. 또 그러다가도 아니 차라리 이런 일이 아주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자조적인 푸념도 늘어놓습니다. 365일 선거철이어라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기록이, 기록물이, 어딘가에서 기록을 관리하는 이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되길, 잊혀지지 않길 바라면서 말이죠.
그렇다면 나의 결말은 어떨까요? 한탸의 선택처럼 기록의 무덤 속으로 들어가 조용한 연대를지키며 시대의 아우성을 속으로 삭혀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살아남아 잊혀져가는 것들을 지켜내야 할까요? 한탸는 지나간 것들의 표상인 자신이 더 이상 가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폐지와 하나가 되는 길을 선택한 것이겠지요. 하지만 여전히 종이, 활자, 기록, 책, 고전과 역사는 사라질 것만 같았던 미래 속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으니, 한탸의 선택이 조금 슬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희망을 가져봐도 될까요? 언젠가는 기록이, 잊혀져가는 것들이 가끔 나오는 정치 이슈가 아닌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소중한 가치를 발휘할 그날을 상상하면서요. 어떤 누군가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면서 삶이 정리된 일기장을 마주하며 웃음 짓거나, 치기어린 시절 삶의 기록을 발견해 얼굴이 붉어질 때처럼, 누구나 저마다의 기록을 만들고 소중히 여기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면 그 정도로도 만족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저의 결말은 너무나도 마주하기 힘들었던 한탸의 모습이 아니길 바래봅니다. 한탸는 잊혀졌지만, 기록과 가치는 여전히 남아, (계란처럼)살아서 죽은 바위를 뛰어넘을 수 있기를 말이지요.

[책 속의 길] 152
이주영 / 삼성라이온즈를 애증하는 대구의 한 기록연구사
이주영 / 삼성라이온즈를 애증하는 대구의 한 기록연구사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주영 / 『너무 시끄러운 고독』
이주영 / 『너무 시끄러운 고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