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면 1.
“조선시대에는 학동들이 맨 처음 『천자문』을 통해 한자에 대한 음훈을 깨침과 동시에 우주와 자연원리에 눈뜨게 하고, 그 다음 『동몽선습(童蒙先習)』 『명심보감(明心寶鑑)』 등을 읽으면서 기초적인 문장해독 훈련과 함께 교훈적인 내용을 터득한 후 『소학』과 『통감(通鑑)』을 배워 문리(文理)를 트고 식견을 넓혔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사서삼경(四書三經)을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시경』 『서경』 『역경(주역)』의 순서로 읽었다. 이 고전 읽기의 커리큘럼은 지난 수백 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거기엔 앞으로의 천년도 넉넉히 견지해 갈 지혜와 방향이 담겨 있다.”
장면 2.
“지난 19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를 요구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자금 대출 연체율은 4.99%에 달했다. 연체건수는 7만4천150건, 연체액은 2천297억원으로 3천억원에 육박했다. 정부가 학자금 대출을 처음 시행한 2005년 연체율은 2.01%(건수 3천780건, 금액 105억원)이었으며 2006년 3.06%(2만1천984건, 657억원), 2007년 2.96%(4만1천455건, 1천266억원), 2008년 2.65%(5만6천456건, 1천759억원), 2009년 3.3%(7만4천133건, 2천394억원), 2010년 3.45%(5만9천1건, 1천858억원) 등이었다. 미국발 금융위기 발발 직후인 2009년부터 연체율이 수직상승하고 있단다. 대출 규모는 해마다 크게 늘어 2005년 29만4천명에 8천923억원, 2006년 51만5천명에 1조6천256억원, 2007년 61만5천명에 2조1천296억원, 2008년 63만5천명에 2조3천486억원, 2009년 67만5천명에 2조5천125억원, 2010년 76만6천명에 2조7천875억원, 2011년 73만3천명에 2조6천853억원이었다.”
장면 1은 7월 21자 중앙일보 정진홍 논설위원의 칼럼 “고전 읽는 아이가 희망이다”의 한 대목이다. 정위원은 고전을 읽는 아이야말로 미래의 희망이라고 말하는데, 한편으로는 그럴듯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엉터리 진단이다. 장면 1에서의 고전 읽기가 오늘날의 공교육에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나름의 설득력이 있을 수 있지만 ‘수학능력고사’나 각종 ‘고시’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엉터리 진단이다. 장면 2는 많은 대학생들이 고금리 족쇄로 인해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빚쟁이 신세가 돼 결국 신용불량자로까지 전락하고 있다는 지난 20일자 뷰스앤뉴스의 기사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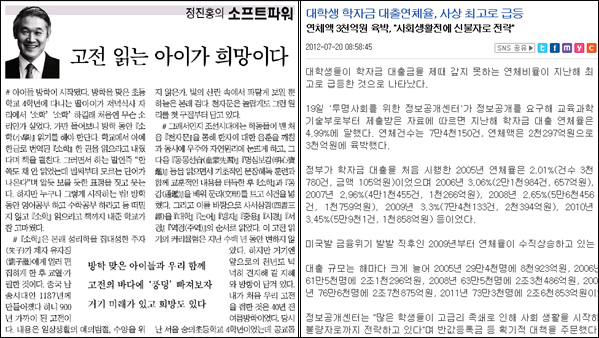
전통사회에서 학동들은 천자문과 사서삼경 그리고 중용과 같은 고전 읽기를 왜 읽었을까? 정말 고전 읽기 그자체가 좋고 재미가 있어서 읽었을까? 물론 소수의 학동들은 좋아서 읽었을 수도 있겠지만 근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다. 당시에도 학동의 교육 목표는 과거에 합격하는 것이었다. 과거에 급제하여 관료가 되는 것만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다. 당시의 과거시험도 요즘처럼 사교육에다 강남 학원의 족보까지 있었다고 하니 과거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다. 한마디로 과거 급제는 개인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길일뿐만 아니라 가문의 영광을 안겨주는 효자가 되는 지름길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화 사회로 접어든 오늘날 우리의 교육 목표는 시대의 변화만큼 달라졌는가? ‘홍익인간’이니 ‘전인교육’이니 하면서 교육의 목표를 내걸고는 있다. 심지어 ‘인격의 완성’이라는 거창한 구호까지 내세운다. 구호상으로는 변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인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법으로 정해 둔 교육 목표는 한낱 구호에 그치고 ‘과거(科擧)’라는 이름이 ‘수학능력고사’나 ‘고시’로 대체되었을 뿐 ‘개인이 출세하는 것이 진리’가 되는 교육의 본질은 예나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
우리사회에서 개인의 출세를 가늠하는 첫 단계는 대학 진학이다. 오직 대학을 위해서만 맞춰진 교육과정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표방하고 있다. 이 교육과정은 ‘수준별 교육과정’이라는 우열반을 편성하여 공부 잘 하는 학생 중심으로, 몇 사람의 스티브 잡스와 안철수를 키우는 교육을 시행하면서 공교육의 파탄을 불러오고 있다. 전체 아이들을 성적순으로 줄세우기 바쁘다는 얘기다. 수요자 중심의 시장경제의 논리 앞에 삶을 가르치는 교사는 무능한 교사가 되고 쪽집게 교사는 유능한 교사로 존경받는 사회로 바뀌면서 ‘교실의 붕괴’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출세하는 것만이 오직 살아남은 길임을 세뇌 당한 아이들은 대학을 들어오는 과정에서 온갖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맛보는 셈이다. ‘홍익인간’ ‘전인교육’ ‘인격의 완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경쟁교육시스템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은 성적순으로 대학을 선택한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 각자는 학벌 앞에서 또 한 번의 승리와 패배를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된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아이들이 선택한 대학은 어떤가? 대학은 그들이 꿈꾸던 학문탐구와 자유 그리고 낭만이 있는 곳이 아니라 자유 시장의 앞마당이 되어버렸다. 대학만 가면 마치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았던 그들에게 대학은 사회의 양심이나 비판자라기보다는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특정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학은 마치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에 등장하는 기능주의와 오웰의 ‘1984’에 등장하는 정치적 일치, 카프카의 ‘심판’에 그려진 관료주의적 부조리를 몽땅 합쳐 놓은 종합 3종 세트와 같은 환경에서 노동 단위를 생산하는 기술공장일뿐이다. 바로 이러한 대학의 변화가 결국에는 아이들을 빚쟁이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대학 안에서 또 다른 좌절을 겪는다. 상업화된 대학의 착실한 먹잇감으로 전락한 것이 대학생의 현주소다.
대학은 어떠해야 하는가? 대학은 젊은이들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다양한 지식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금전적 가치가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매혹적이고 독창적인지를 기분으로 판단하도록 격려하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가치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어야 한다. 대학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교육과 인재 양성이 아닌가. 대학이 상품개발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안 된다. 대학의 본질은 오직 교육에 매진하고, 학생들의 창의성 개발을 돕고, 장기적인 기초연구를 통해 지식의 경계를 확장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의 저명한 여류 정치철학자 마사 누스바움은 “교육이란 단지 사실과 문화적 전통에 대한 수동적 흡수에 관한 것이 아니며, 정신 활동의 능력을 배가할 수 있도록, 복잡다기한 세계에서 사려 깊게 비판적ㆍ비평적일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과연 지금과 같은 방식의 한국 교육으로 스스로 사고하고 비판하며 타인과 공감하고 사회와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책임성을 갖춘 시민을 제대로 길러낼 수 있을까? 출세만이 살길이라고 알고 있는 저 젊은이들에게 빚쟁이라는 범죄사유까지 덧붙이는 이런 비정상적인 구조가 과연 지속가능한 일인가? 늦은 감이 있지만 비정상적인 우리 대학들은 젊은이들을 계속해서 빚쟁이로 몰고 갈 것인지, 아니면 이 복잡다기한 세계에서 사려 깊게 비판적ㆍ비평적일 수 있도록 훈련할 것인지를 분명히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서 있다.

[이재성 칼럼 37]
이재성 / 계명대 교양교육대학 교수. 평화뉴스 칼럼니스트. ssyi@kmu.ac.kr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