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을 붙잡고 교실에서 진정시키려고 같이 쉼 호흡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막대기를 들고와서 머리를 찍어 내렸다"
10년차 대구 초등학교 A교사(여성)는 26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교사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지난 2019년 본인이 겪은 아픔을 털어놓으며 눈물을 흘렸다. 담임을 맡은 반의 5학년 학생은 '분노조절장애'였다. 극도로 흥분한 상태의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무차별적 폭력이 쏟아졌다.
교권보호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때부터 학부모의 민원이 이어졌다. "작년 담임은 뺨을 맞고도 참았는데 당신은 왜 못 참냐"고 따졌다. 학부모는 수차례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교육청 감사를 청구했다. A교사를 징계하라는 것이다.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병가를 내고 식당에 갔더니 학부모가 "아픈 사람이 어떻게 돌아다니냐"며 다시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다. 돌발성난청과 불안장애가 생겼다. 비슷한 낭 학부모만 봐도 심장이 떨리는 증상도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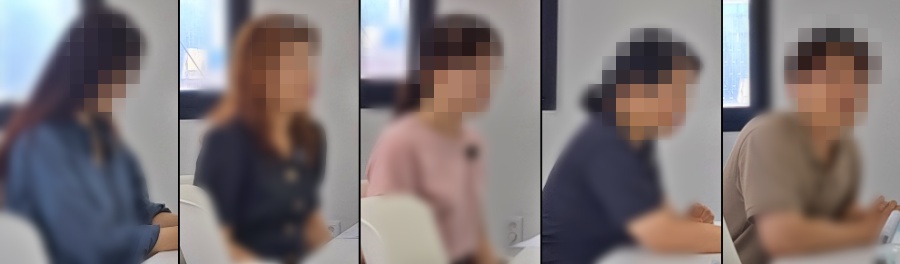
A교사는 "내가 생각한 교직은 이런 게 아닌데...아이들을 사랑하고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제는 치욕스럽고 자부심이 사라졌다. 한밤 전화는 우습지도 않다. 일일이 대응하는 과정이 괴롭다. 내가 왜 이렇게 참아야 하나. 그 사람도(숨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신규 교사) 이런 심정이었을까. 대응해보려고 여기저기 방법을 찾아봐도 다들 '시간이 지나가기만 바라'라고 말한다. 나도 그때 참을 걸 그랬다. 이제는 학교, 교실이 너무 무섭다"고 말하며 격분했다.
#2. 수성구의 18년차 초등학교 B교사(여성)도 비슷한 사례를 고발했다. "책 펴라고했더니 XXX아는 기본이다. 쌍욕, 욕설, 폭언은 그냥 한다. 한 학생이 그 말을 하면 그 반에 독이 다 퍼진다. 다음에 가면 다른 학생들도 동조하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다. XX, 담임X 성희롱성 발언도 다반사다. 그런 폭언으로 교보위를 열면 아마 학교의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핵심 학군 수성구에서 더한 경우를 많이 겪었다고 고백했다. "30만원 지갑을 훔친 학생의 학부모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했더니 교사가 여지를 줬다고 길길이 날뛰었다. 또 학생 하나가 녹음기를 들고와서 내 모든 발언을 녹음하고 기록해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징계하라고 교감을 3주나 조른 적도있다. 징계를 않으면 교육청에 가겠다, 신문고에 가겠다, 고소한다는 협박도 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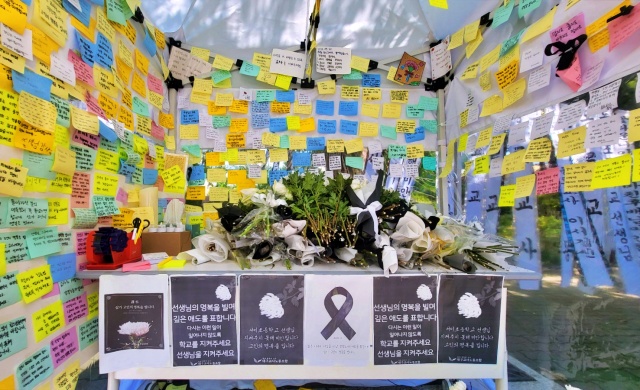
뿐만 아니라 "친구 목을 조른 학생이 있어서 그러면 안된다고 했더니 학부모가 학교에 와서 나에게 화풀이를 하고 폭언을 했다. 생활기록부 종합의견에 적은 의견이 마음에 안드니 지우라고 행패를 부린 적도 있다. 2016년까지는 '죄송하다'는 학부모들이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 심해졌다. 학교는 나의 권리를 찾는 곳, 하나라도 부당하게 대우받으면 안되는 곳이 됐다. 공교육은 무너졌다. 처참하다"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서이초 교사 사건 후 전국 교사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지역별 갑질 미투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대구 현직 초등학교 교사 5명도 이날 대구교사노조 사무실에 모여 각자의 아픔을 토로했다. 이른바 금쪽이(문제 행동을 일삼는 어린이를 일컫는 말) 학생의 폭언과 폭력에 시다리는 교사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학부모가 이에 맞서 해당 교사를 상대로 갑질 성격의 악성 민원을 제기하거나 아동학대법을 근거로 교사를 괴롭히는 형태가 많았다.
교실에서 교사의 교육권, 훈육권, 지도 수단은 사실상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그 탓에 온전한 교육을 하지 못하고, 악성 민원에 시달리지 않을 정도만 교실을 운영한다는 것이 교사들의 고백이다. 조심해도 온갖 갑질에 시달리는 교사는 많고 정신과 등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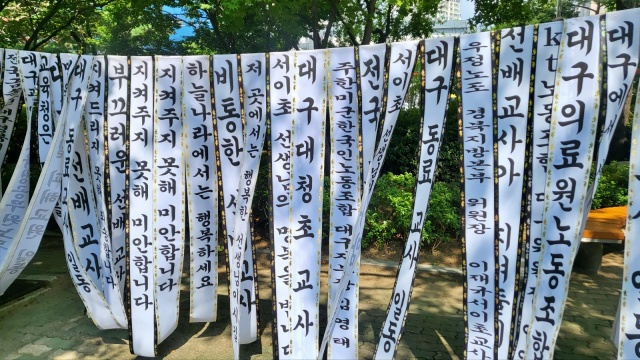
#3.12년차 초등학교 C교사(여성)는 오후 11시, 자정을 넘겨 새벽에도 학부모로부터 민원 전화가 걸려와 1시간 동안 막말을 들었다고 고발했다. 폭력을 저지른 학생을 지도했더니 '애가 없어서, 결혼을 안해서 이해 못한다'는 학부모의 황당한 막말을 듣기도 했다. "학부모들의 욕받이, 감정쓰레기통이 된 느낌이 종종든다. 1시간 동안 욕을 듣고나면 스트레스와 무력감이 물도 못한다"고 말했다.
보호막 없이 교실의 폭력에 홀로 내버려진 교사들이 가장 만이 듣는 말은 "참아라"다. 시스템이 있지만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제도적으로 이들을 보호할 시스템도 촘촘하지 못한 탓이다.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이 대구교육권보호센터 문을 열었지만 상담사는 고작 2명에 불과하다. 지역 교사 20,000여명을 모두 담당하기에는 상담사 숫자가 너무 적다.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들도 사람이다. 우리는 인권도 없나. 인권이라도 제대로 보장해주면 된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민원 업부를 교사에게서 분리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업무용 투폰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아동학대법도 개정(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면책)해야 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